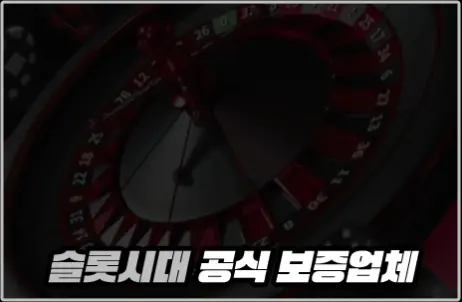'더 글로리'와 '세치혀'가 '집이 없어'에게 배워야 할 것
컨텐츠 정보
- 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위근우의 리플레이]‘더 글로리’와 ‘세치혀’가 ‘집이 없어’에게 배워야 할 것
여기 가정폭력에 대한 두 가지 풍경이 있다. 하나는 지난 3월10일 파트2를 공개한 넷플릭스 오...
m.khan.co.kr

여기 가정폭력에 대한 두 가지 풍경이 있다. 하나는 지난 3월10일 파트2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 잘 알려졌듯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이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을 응징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가 겪은 폭력의 또 다른 한 축은 어머니에 의한 폭력이다. 동은의 어머니 정미희(박지아)는 딸이 겪은 학교폭력에 대해 함께 분노하고 싸워주기는커녕 가해자 측의 합의금을 받아 부적응이라는 사유로 자퇴서에 서명하고, 그 합의금을 가지고 딸을 방치한 채 야반도주한다. 동은의 대사를 빌리면 그는 “첫 가해자”이며 본인은 그 사실을 “지금도 모르기 때문”에 복수의 대상이 된다. 당연히 시청자들은 동은의 분노와 복수에 공감했다. 작품의 핵심 악역인 박연진(임지연)을 포함한 학교폭력 가해자들보다 미희가 더 밉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또 하나의 풍경은 지난 3월7일 방영한 MBC 예능 (이하 )다. ‘혓바닥 파이터’로 출연한 그룹 코요태 멤버 빽가는 엄했던 어머니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했다. 고등학생 시절 통금시간이 저녁 8시였던 그는 “언제까지 마마보이로 살 거냐”는 친구들의 도발과 꼬드김에 늦은 시간까지 놀다가 막차를 타고 귀가했다. 집에 들어가니 아직까지 기다리던 어머니 옆에는 길고 두툼한 건축용 자가 있었다. 잔뜩 긴장했지만 저자세면 더 혼날까봐 와서 앉으라는 어머니에게 싫다고 대거리를 하자 어머니는 자를 휘둘렀고 빽가는 나름 호기롭게 손바닥으로 막은 뒤 너무 아파 주저앉았다. 이게 나름 이 이야기의 웃음 포인트인데 어머니가 가로가 아닌 세로 방향으로 자를 휘둘렀기 때문이다. 방송의 모든 이들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다. 애한테 자를 휘둘렀다고? 그건 가정폭력이잖아. 연락 없이 늦은 게 잘못인 것도 맞고, 와서 앉으라는데 뻗댄 것도 잘못이 맞는데, 묵직한 자를 휘둘러 때린 것도 폭력이 맞다. 한편에선 픽션의 주인공이 당한 가정폭력 이야기에 울분을 토하는데, 다른 한편에선 실제 사람이 고등학생 시절 자로 맞아 아파 뒹군 이야기에 재미있다며 웃는다. 이 간극에 나는 현기증이 난다.
이 두 풍경 사이의 간극에 대해 비판하기란 어렵지 않다. 두 풍경에 대해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중적 잣대이며 예능에서 이런 폭력을 웃음의 소재로 사용하는 걸 지양해야 한다고. 여기서 잘못의 책임은 를 비롯해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폭력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방송에 있다고. 온당한 지적이다. 다만 이 관점은 왜 시청자들이 이중적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선 충분히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저 예능의 웃음에 마냥 휩쓸리지 말라고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불완전함을 채우기 위해선 전제를 바꿔야 한다. 실은 이 간극이 이중적이거나 모순이 아니라는 것. 와 에 대한 서로 다른 반응이 실은 거의 동일한 반응이라는 것.
누가 봐도 분노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의 폭력 묘사는 직관적이다. 특히 미희가 성인이 된 동은 앞에 나타나 고기 굽는 소리로 화상에 대한 동은의 트라우마를 자극하고, 동은이 괴로워하자 옳다구나 아예 집에 불을 내버리는 모습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딸을 보호하기는커녕 본인이 착취할 대상으로만 보는 미희의 태도엔 분명 가정폭력의 어떤 본질이 있다. 하지만 그 폭력이 누가 봐도 분노하도록 높은 강도로 재현될 때 정작 폭력의 본질은 가려지고 강렬한 자극으로서의 폭력의 이미지만 남는다. 문제는 고강도의 가정폭력을 재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강도의 폭력으로만 재현하며 정작 일상적 폭력의 중범위(middle range)가 그려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특수성과 비극성은 사실 그 일상성에 있다. 폭력의 피해자인 동은을 방치한 채 떠난 미희에겐 일말의 알리바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음껏 비난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가정폭력은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때리는 일상의 순환 속에 존재한다. 자잘한 잘못을 하는 아이와 적당히 패고 달래는 부모 사이의 불투명함에 비해 흠 없는 동은과 악인인 미희의 피해·가해 구도는 너무나 선명하다. 불투명한 삶에서의 폭력을 직시하고 비판할 전망을 남기지 못하는 폭력 재현은 현실과 분리되어 다분히 장르화된다. 다시 말해 미희에 대한 분노는 현존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감정이 아닌 장르화된 세계에 대한 익숙한 소비 방식에 가깝다. 이처럼 중범위를 벗어난 극단적인 가정폭력 묘사가 장르화되듯, 역시 중범위의 일상성을 슬쩍 벗어나는 특이한 폭력 역시 장르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분노가 아닌 폭소의 방식으로.